|
|
어제 보건소를 다녀왔다. 리투아니아인 아내가 동행할 계획이었다. 어제는 아내가 쉬는 날이라 보건소 예약을 세 군데나 했다. 요즈음 리투아니아에도 아주 편해졌다. 인터넷으로 담당의사 진료예약을 하고 시간에 맞추어 가면 된다. 인터넷 예약이 없었을 때는 의사 근무시간에 맞추어 복도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.
요가일래 진료, 아내 진료, 나 진료 셋 모두 장소가 각각 다른 보건소였다. 3시, 4시, 5시였다. 내 진료예약 시간이 다가오자 아내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다. 아직 아내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으니 혼자 담당의사에게 가라고 했다. 아내가 없으니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을 듯 했다. 하지만 다시 또 예약하려면 시간이 마냥 지체될 것 같았다. 진료 도중 아내가 도착한다면 다행이고,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보건소로 달려갔다.
리투아니아는 1차적으로 가정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, 필요한 검사와 해당 전문의를 결정한다. 이날 처음 대면한 가정의사는 참 친절했다. 편하게 대화했다. 낯선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다.
"리투아니아어 잘 하시네."
"정말 어려워요."
문법과 강조음이 형편 없다고 늘 생각하는 데 리투아니아인들은 칭찬을 마다하지 않는다. 당연히 외국인이니까 문법 등은 서툴지만 일단 리투아니아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칭찬하는 것 같다.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는 이렇다.
"어느 나라에서 왔어요?"
"한국에서."
"그렇게 먼 나라에서?! 온지 얼마나 되었어요?"
"10년."
"리투아니아에 50년 이상을 산 외국인들 중 아직 리투아니아어를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"라는 말이 첨가된다. 그리고 이들은 새내기 동양인이 말하는 것에 아주 만족스러워 한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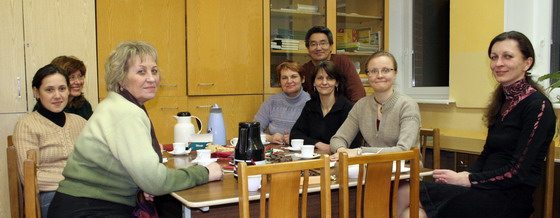 ▲ 2007년 봄 함께 리투아니아어 강좌에 참가했던 리투아니아 거주 외국인들
▲ 2007년 봄 함께 리투아니아어 강좌에 참가했던 리투아니아 거주 외국인들
보건소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모임을 나가려고 했다. 아내는 아직 아파트 내에 있었다. 먼저 현관문을 나오려는 참이었다. 그때 10미터 전방에서 할머니 두 분이 오고 계셨다. 현관문을 잡고 두 분을 기다렸다. 잠긴 문을 열려면 코드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따른다.
"안녕하세요. 들어가세요."라고 열린 문을 잡은 채 말했다.
"역시 외국인은 달라!!!"라고 답했다.
잠시 후 내려온 아내가 말했다.
"방금 할머니들이 당신을 존경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어. 리투아니아 사람 같으면 인사도 없이 그냥 모르는 척 문을 확 닫고 가버렸을 거야."
"인사 한 마디 하고 현관문 잡고 잠시 기다렸을 뿐이데 존경이라는 단어까지 듣다니......"
그렇다. 단기든 장기든 외국에 살면서 그 나라의 인삿말을 익혀 적어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꼬박꼬박 인사하고 현관문 잡는 것 같은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만 '존경'이라는 영광스러운 단어를 수확할 수 있게 된다.
3층에 사는 한국사람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소문을 할머니들이 쫙 퍼트리면 앞으로 더욱 더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하니 부담스러워서 어쩌나......
요가일래 진료, 아내 진료, 나 진료 셋 모두 장소가 각각 다른 보건소였다. 3시, 4시, 5시였다. 내 진료예약 시간이 다가오자 아내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다. 아직 아내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으니 혼자 담당의사에게 가라고 했다. 아내가 없으니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을 듯 했다. 하지만 다시 또 예약하려면 시간이 마냥 지체될 것 같았다. 진료 도중 아내가 도착한다면 다행이고,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보건소로 달려갔다.
리투아니아는 1차적으로 가정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, 필요한 검사와 해당 전문의를 결정한다. 이날 처음 대면한 가정의사는 참 친절했다. 편하게 대화했다. 낯선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다.
"리투아니아어 잘 하시네."
"정말 어려워요."
문법과 강조음이 형편 없다고 늘 생각하는 데 리투아니아인들은 칭찬을 마다하지 않는다. 당연히 외국인이니까 문법 등은 서툴지만 일단 리투아니아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칭찬하는 것 같다.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는 이렇다.
"어느 나라에서 왔어요?"
"한국에서."
"그렇게 먼 나라에서?! 온지 얼마나 되었어요?"
"10년."
"리투아니아에 50년 이상을 산 외국인들 중 아직 리투아니아어를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"라는 말이 첨가된다. 그리고 이들은 새내기 동양인이 말하는 것에 아주 만족스러워 한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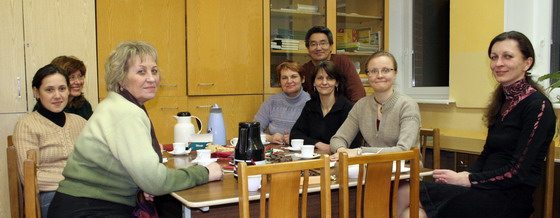
보건소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모임을 나가려고 했다. 아내는 아직 아파트 내에 있었다. 먼저 현관문을 나오려는 참이었다. 그때 10미터 전방에서 할머니 두 분이 오고 계셨다. 현관문을 잡고 두 분을 기다렸다. 잠긴 문을 열려면 코드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따른다.
"안녕하세요. 들어가세요."라고 열린 문을 잡은 채 말했다.
"역시 외국인은 달라!!!"라고 답했다.
잠시 후 내려온 아내가 말했다.
"방금 할머니들이 당신을 존경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어. 리투아니아 사람 같으면 인사도 없이 그냥 모르는 척 문을 확 닫고 가버렸을 거야."
"인사 한 마디 하고 현관문 잡고 잠시 기다렸을 뿐이데 존경이라는 단어까지 듣다니......"
그렇다. 단기든 장기든 외국에 살면서 그 나라의 인삿말을 익혀 적어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꼬박꼬박 인사하고 현관문 잡는 것 같은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만 '존경'이라는 영광스러운 단어를 수확할 수 있게 된다.
3층에 사는 한국사람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소문을 할머니들이 쫙 퍼트리면 앞으로 더욱 더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하니 부담스러워서 어쩌나......
|
|


